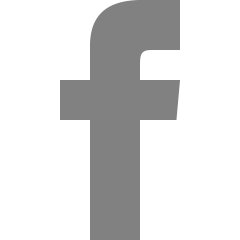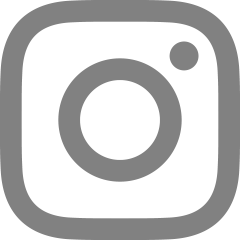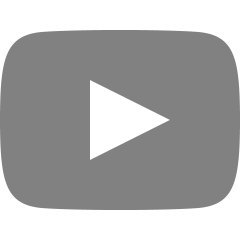안태운, 오송
눈을 떴고 어두웠고 지금은 새벽이군, 어렴풋이 인식했고 당연한 일이라며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여전히 어두웠고 순간 나는 새벽이라는 시간을 무수히 지나쳐왔다고 느끼게 되었다. 새벽, 그렇게 있으면서 새벽에 깨어나면 눈뜬 채 가만히 누워 있기도 간혹 앉아보기도 했고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새벽은 매번 지나가고 있었고 또다른 새벽에는 물론 꿈속이었을 테고 어느 날 깨어날 때도 눈감은 채 잠을 청하거나 날 밝길 기다렸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았다면. 깨어난 새벽마다 어디든 나가보았다면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어떤 일을 겪었을까. 그러므로 나는 새벽, 지금에라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느꼈네. 몽롱한 상태로 마침 이곳은 고향집이었으므로 더 가볼 수 있는 곳은 시내가 아니라 제(堤)일 것 같아서. 물과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가보자 하면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했고 향하는 동안 날파리 한 마리가 내 눈앞에 날아들어서 눈을 감았고 나는 그 눈 감는 순간이 마치 날이 저무는 듯 천천히 지속되는 듯 그렇게 내가 천천히 눈을 감아 내 눈을 내어주는 듯해서 오래 기억할 것만 같았는데 이내 날파리는 사라지고 없는데 내내 걷고 있었으므로 눈앞에는 제가 나타났는데. 서서히 드러나는 제, 그 물과 주위를 둘러싼 나무들. 나는 이 새벽 여름이 좋았고 제를 돌았고 서서히 밝아질 것 같아 하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며 걸어가고 있다. 문득 이 제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 제의 물을 다 빼낸 적이 있었어. 정비 사업을 한다고 관청에서 사람들이 왔었지. 마침내 제의 물을 다 빼냈고 물이 다 사라지니 남은 것은 물속에 있던 선연한 물풀과 물고기. 어떤 주민들은 거기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 몇몇은 물고기를 품은 채 데려갔나. 그 물고기를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을까. 몰라.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하지만 관청에서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몰라. 이윽고 제는 다시 물로 채워졌어. 물이 다시 생겼다. 생겨났다. 빼냈지만. 그러하여서 내가 지금 둘레를 걷고 있는 이 제의 생태계에는 온갖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데, 실잠자리와 미나리, 갈대, 쇠물닭, 왜가리, 부들, 물꼬리풀, 거미, 송사리, 소금쟁이가 있었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다가도 나는 시간이 지나 뜨거워질 한낮을 떠올려보기도 했고 한낮의 조그마한 그늘을 지나가고 있을 개미가 연상되기도 했는데. 한낮이라면 집이나 카페에 앉아 나는 가만히 머물 텐데 무더위를 피하며 하루를 날 텐데 하지만 지금은 새벽이라 좋았고 다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한 달 전쯤에 이 제를 거닐었던 기억,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그날에도 나는 고향집에 있었으므로 비를 바라볼 수 있었고 우산을 쓴 채 밖을 거닐고 싶었고 그때도 마음껏 거닐 수 있는 곳은 이 제였으므로 향하여 갔고 비가 몰아쳤지만 제 둘레의 산책로로 들어서면서는 아늑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숲이 우거져 있었으니까. 비는 나무 이파리들에 닿은 후 흘러내렸으니까. 나는 쏟아지기보다는 흘러내리는 비를 맞고 걸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 빗소리를 내내 들으면서 돌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개구리 소리가 울렸다. 그게 좋았다. 좋았어. 소리만 들리다가 순간 개구리가 정말로 산책로에 나타나기도 하여서 그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는데 풀쩍풀쩍 뛰는 여러 마리의 개구리가 왔다갔다하고 나는 놀라고 혹시나 내가 밟을까봐 조심조심 바닥만을 바라보면서 걷고 옆으로 시선을 옮기면 수면의 생기, 무수히 일어나는 기척들, 내리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꿈틀거림이 파다하고 나는 한 인간을 떠올리기도 했다. 오래전 한 인간은 물에서 당연하다는 듯 숨쉬며 걸어갔을 텐데 물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내 잠겼고 평소처럼 물속에서도 숨을 쉬었겠지만 이상하다는 감각, 못 참겠다고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물속이라는 건 기이하군, 깨달은 인간이라니. 나는 그 인간의 표정을 어느새 수면을 통해 바라보는 듯도 했다. 그날 나는 어땠나. 나는 비 오는 제를 몇 번이고 걸을 수 있었나. 이곳을 자주 오는 이유를 물론 내내 알아채고 있었나. 왜냐하면 제의 근방에 우리 개가 묻혀 있으니까. 나는 여름이 되어 무성해진 이곳을 돌면서 안도감이 들었다. 제의 둘레와 잠시 멀어져 우리 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향하면서도 모든 게 자라나 있었으니까 마음이 놓였어. 이것들이 우리 개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부러 풀을 헤치며 무덤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 다만 다시 제를 돌았고 우리 개를 떠올렸고 나는 우리 개의 꿈을 자주 꾸며 살아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마리의 꿈을 자주 꾸며 살아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마리의 꿈 중 하나가 기억났는데. 꿈속에서 나는 우리 개를 잃어버렷고 순간 똑같이 생긴 우리 개가 여러 마리 나타났어. 우리 잘 지내자고? 뒤돌아가보자, 하며 함께 걸었는데 그때 나는 이제 안 잃어버릴게, 하고 다시 뒤돌아봤는데. 우리 개의 꿈들은 반드시 잠 깨게 하는 꿈 같다. 새벽을 맞이하게 하는 꿈 같다. 동트지 않았는데도 일어나게 하는 꿈 같다. 그때마다 나는 꿈에서 깨기 직전 우리 개가 내 왼쪽 겨드랑이에서 자가다 움직여 내 오른쪽 겨드랑이로 옮겨 오는 감촉을 느끼는 듯했는데 나는 깨어나며 머금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눈물이 흘렀는데. 이따금 고향집에 머물며 제를 돌면서는 서러운 꿈 감각, 서러운 꿈 감각, 하며 되뇌었던 기억이 있었고 지금 여름 새벽 나는 이 제를 걷는군요. 아침이 되어갈 것 같군요. 이윽고 날이 밝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영영 날이 밝아지지 않을 것도 같다. 새벽, 나는 제에 다가가 물속에 손을 담그는군요. 손으로 휘젓네. 내 손의 움직임을 느끼며 순간 기척할 생물들이 있고 나는 제를 떠나고 있고 몇 시간 뒤 한낮에는 그늘 아래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새벽 여름, 나는 잠긴 채 있었구나. 나는 잠긴 채 있었어. 훗날 깨달았지.
'Life > book and though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윤제, 저는 내년에도 사랑스러울 예정입니다 (1) | 2024.12.23 |
|---|---|
| 박준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1) | 2024.12.04 |
| 20241014 (0) | 2024.10.14 |
| 필사 (0) | 2024.04.30 |
|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 - 박노해 (0)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