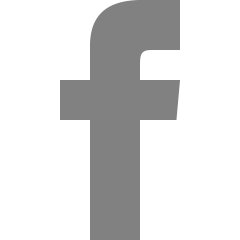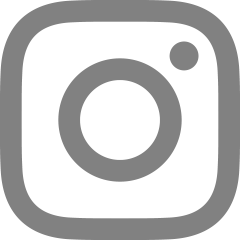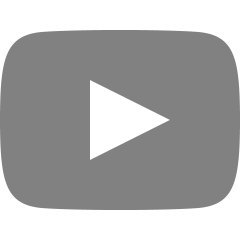피프티 피플
"있잖아, 우리가 50년쯤 후에 다 같이 죽을 거라는 것보다 30년쯤 후에 다 같이 고아가 될 거라는 게 더 무섭지 않아?"
이면의 이경 따위, 표면과 표면만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 옆구리에 낀 나일론 가방은 낙하산을 만드는 소재라고 했다. 한영은 낙하산을 써본 적 없지만 기분만은 알 것 같았다. 제대로 탈출하는 기분만은 말이다.
밤새 또 누가 살해를 당하고 사고를 당했을까. 윤나는 두 팔을 올려 스트레칭을 했다. 살아 있는 게 간발의 차이였다. 그 '간발 차'의 감각이 윤나를 괴롭혔다. 자칫했으면 이 팔들이, 살아있는 팔들이 썩고 있을 뻔했다. 죽음은 너무 가깝다. 언제나 너무 가깝다. 전철에서 지나치게 몸을 밀착하는 기분 나쁜 남자처럼 가깝다. 무시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윤나는 늘 등 뒤를 돌아보고야 마는 편이었다. 전철 전체가 암전되듯이 마음 전체가 까매지고 마는데도.
윤나도 병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부르기까지 오래 걸렸다. 시를 쓰고 나서였다. 알고 보니 세상에서 자기 아프다는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시인들이었다. 아프다는 말을 아름답게 해버리는 동료들 덕에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도 여럿이었다. 윤나는 개운해진 한편 가끔 아연하기도 했다.
"너는 달라. 너는 필요해." 규익의 눈에 의아함이, 그리고 곧바로 이해의 기미가 스쳐 지나갔다. 윤나의 착각일지 몰라도, 엉망으로 말했어도, 분명 전하고 싶었던 것이 전해졌을 때의 눈빛이었다. 학생들의 눈에서 그 빛을 발견할 때가 많았다. 수신의 빛, 이라고 속으로 부르곤 했었다. 더 하고 싶은 말들은 많았지만 미뤘다. 윤나가 다시 수업을 할 수 있다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문밖에서부터 구운 생선 냄새가 났다. 여전히 생선은 맛있다. 어릴 때 먹었던 만큼 맛있다. 충분히 먹었다는 생각이 든다. 호 선생은 별로 욕심이 나지 않는다. 발밑에서 큰 파도가 다 부서져도 좋다. 지금껏 너무 많이 가졌다. 잃어도 좋다.
엄마 아빠가 하와이에 갔을 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부모 사이가 좋은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실연이 예상될 때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다. 울면서 엎드려 있어야 할 때 두 사람이 사랑의 기운을 뿜어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엄마 아빠의 하와이 여행이 찬스였다. 어제 마지막으로 남자친구를 만나 정리했다. 영린은 침대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아 몸속의 댐을 상상하며 수위가 언제 차오를지 기다렸다. 그 좋다는 데 따라갈 걸 그랬나. 하지만 혼자 엉엉 울 수 있게 집이 텅 비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있잖아, 마음에 갈증 같은 게 있는 사람은 힘들다?" 영린과 함께 산 지 얼마 안 되어 새엄마가 말했었다. "네?" "그런 사람은 항상 져. 내가 보기엔 네가 힘든 게 몸무게 때문도 아냐. 마음 때문이야." 그걸 지적해준 사람은 처음이었다. 둔하디둔한 아빠가 똑똑한 아줌마와 결혼했구나, 영린은 약간 울면서 감탄했다. 갈증, 허기, 구멍은 모두 같은 걸 가리켰다. 영린의 안쪽에 있는, 그 비어 있는 곳.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가 크면서 해결해야겠지만, 몸무게 때문에 더 힘들면 그건 지금 해결해보자. 돈으로 못 빼는 살이 어딨니?"
어째서 고르는 족족, 혹은 영린에게 먼저 다가오는 족족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영린은 스스로의 형편없음이 다른 사람의 형편없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증폭시키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다. 짧거나 긴 연애가 끝날 때마다 생활이 무너졌다. 그 무너짐을 부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늦도록 밖에서 울었다.
솔직히 은색 지프차는 다 비슷하게 보였다. 면허증만 따두었을 뿐이라 자동차는 아직 영린의 관심 분야가 아니었다. "영린이는 소탈하구나."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상하게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어떤 시험을 통과한 것만 같았다. 그런 대화가 자꾸 반복되었다. 불안한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데는 시험만 한 게 없었다. 영린은 게다가 남자친구를 정말로 좋아했다. 그때까지의 남자친구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 어떻게든 시험을 통과하고 싶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긴장했다.
"어머님 항상 이 브랜드 쓰시니?" "아니, 그냥 이것저것 섞어서......" 내가 왜 엄마 대신 변명해야 하지? 엄마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좋은 거 쓰는 건데 왜? 영린은 약간 언짢아졌다. 지금은 꽤 풍족하지만 아빠가 명예퇴직을 당했을 때는 안 좋을 때도 있었다. 그리고 따지자면 학생이면서 운전을 하는,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자기 차가 있는 남자친구도 그렇게 환경이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이상하게 구는 게 속상했다. 남자친구네 어머니 화장대를 한번 뒤져보고 싶을 정도였다.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아는 노래가 나왔을 때는 또다른 종류의 시험을 당했다. 오래된 밴드의 첫 앨범에 들어있는 곡으로,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몰입하여 부르는 노래였다. "우와, 나 이 노래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 좋아하던 남자애가 노래방에서 이거 잘 불렀어요. 옛날 생각난다." "정말? 이 노래를?" 그렇게 반문하는 목소리에 비웃음이 담겨 있어서 이번에는 영린도 싫은 티를 냈다.
오늘만큼은 시원하게 울고 싶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눈물이 차오르지 않았다. 영린은 울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일어서서 거실로 나왔다. 턴테이블은 굉장이 낯선 물건이었다. 부모님이 그걸 사왔을 때는 살짝 의아했지만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고 나니 깨끗하지 않은 소리가 오히려 매력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노래. 남자친구가 깎아내렸던 노래. 하지만 원래의 록 버전이 아니라 달콤한 목소리의 여자 보컬이 편곡해서 부른 보사노바 버전이었다. 판을 걸고 부엌으로 갔다. 비빔면. 비빔면을 먹을까. 딱 맞는 조그만 편수냄비를 찾아서, 마치 그 손잡이가 연인의 손인 것처럼 멀리 보냈다가 가까이 당겼다. 장난스럽게 부엌에서 거실까지 춤을 췄다. 어두운 거실 유리가 거울처럼 영린을 비추었다. 괜찮아, 예뻐. 스스로 말해본 건 처음이었다.

'Life > book and though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막으로 (0) | 2023.09.19 |
|---|---|
| To. many frens around me (1) | 2023.09.19 |
|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조각들 (2) | 2023.09.05 |
| 우정 도둑 - 대체로 답장이 늦는 연인 (4) | 2023.09.01 |
| 배철현의 요가수트라 강독 (1) | 2023.08.21 |